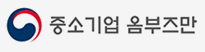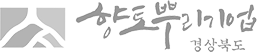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견뎌온
경상북도의 뿌리 깊은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이곳 정미소는 30년 전 그가 인수하기 훨씬 전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었다.
당시 이곳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에는 200여 호가 살았던 만큼 넓은 논밭도 많았고, 그만큼 벼를 도정해 주는 도정공장이라 불리는 정미소가 마을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였다. 대구에서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그만두고, 운전 일을 하던 그는 늘 힘겨웠다.
그러던 중 외삼촌이 방앗간을 해서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언젠가는 방앗간을 하리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만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기회만 엿보던 중이었다. 당시에는 도정공장, 즉 정미소를 모두 방앗간이라 불렀다. 마을 계곡에 있는 물레방아, 동물을 이용해 돌렸던 연자방아, 시골집 안이나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던 디딜방아가 진화하여 자동차 엔진이나 전기를 이용한 큰 기계가 생겼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방앗간이라 불렀다. 당시에는 과수원과 양조장을 포함해 정미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고을 원님 부럽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것이 꿈이고, 희망이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고향이 이곳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인 아버지가 자주 왕래하던 이곳에서 정미소를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동안 늘 가슴에 품어왔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흔쾌히 아들을 위해 전답을 팔아 목돈을 마련해 주었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도정 기계를 돌렸다가 주인이 몇 번 바뀐 정미소가 막 자신의 품으로 온 것이다. 설레는 꿈을 안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러나 정미소와 마주하는 순간,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양철판으로 대충 얼기설기 엮은 초라한 건물과 먼지를 뒤집어 쓴 기계는 이미 녹슬거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미소와 붙어있는 집이란 것도 형편없었다. 가슴에 돌덩이가 들어앉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절망만 하기엔 젊고, 패기가 있었다. 그는 긍정의 힘을 믿었고, 더구나 자신만 바라보고 무작정 따라나선 서울 태생의 아내에게 힘겨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열심히 돈을 모아 다시 대구에 가서 살자고 아내를 설득했다. 자신도 그렇게 하리라 다짐을 한 터였다. 이렇게 평생을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자 쌀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벼농사에서 밭작물로 바꾸는가 하면 아예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쌀값은 정체되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차이가 없고 보니, 도정료를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쌀로 받는 정미소의 특성상 어려움은 더해갔다.
그래도 아이들을 대학까지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억척 같이 부지런했기 때문이다. 정미소를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까지 방앗간을 꾸려서 먹고 살았는데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은 스스로도 용납이 되지 않았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과 방금 다녀온 논과 밭,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비록 낡고 퇴색되었지만 이 정미소 덕이었다. 바쁘게 살아왔던 것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희망과 꿈을 이곳 정미소에서 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아무도 없는 정미소 안에서 도정기계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먼지 낀 기계를 쓰다듬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당시에 있던 그대로다. 다만 가운데 기둥만 시멘트로 다시 올렸을 뿐이며, 얼기설기 서로 맞물려 있는 통나무 기둥들은 여전히 힘을 받치고 있다. 지난 세월 손때가 묻은 됫박과 말통을 바라보며 또 다시 회상에 잠긴다.